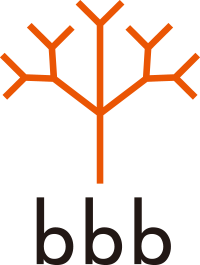소통의 미래, 미래의 소통
김은희 작가
낯선 이로부터 재미난(?) 메시지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가 나가서 내 딸을 훈련시키길 바래.”, “죄송합니다. 나는 직장에서 보지 못했다. 우리 현장을 통해 수업할 수 있지?”, “내 일이 비교적 바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 소프트웨어를 처음 사용했기 때문이다. 현장을 통해 현금을 지불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일본에 있습니다. 나는 엔화로도 너에게 지불할 수 없다.”, “나는 방금 시도했다. 아이는 지금도 나와 함께 일본에 있다. 나는 다음달 에야 그녀를 데리고 갔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장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내가 일을 마쳤을 때. 내가 너에게 전화해서 말해 줄게.”
나는 이 글의 내용을 대체로 이해하지만, 처음 접하는 이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을 것이다. 내가 하는 몇 가지 일 중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있다. 업력이 쌓이다 보니, 이런 일거리 제안이 가끔 들어온다. 글쓴이의 신분을 추측하건대, 외국인 부모인데, 부인지 모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심지어, 부부 둘 다가 외국인인지, 그중 하나만 외국인인지도 도통 알 길이 없다. 국적도, 나이도, 외모도, 성 정체성도, 나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물어보지 않는 이상. 하지만 그런 걸 묻는 건 너무 이상하지 않은가. 나의 질문은 일에 필요한 질문이어야 한다. 호기심을 견디다 못해 내지르는 질문이어서는 안 된다. 가장 이상적인 대화란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대화니까. 그리고 대화의 행간을 메우는 일은 온전히 나의 몫이니까.

아무튼, 내가 아는 몇 가지 정보로 얼기설기 맥락을 엮어보자면, 그들은 현재 부산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이들 방학을 맞아 일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짐작된다. 왜냐하면 내게 제안한 내용이 아이들 한글 수업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왜 한국어 혹은 한글 능력이 필요할까. 그 아이들은 어떤 언어가 모국어일까. 혹은 어떤 언어가 더욱 친숙할까. 사실, 이런 생각은 아주 짧은 찰나에 스치고 지나갔다. 내가 진정으로 흥미를 느낀 부분은 부모님의 메시지 상태였다. 누가 봐도 번역 앱을 돌린 한국어이지 않은가. 대단히 흠이 많은 문장이지만, 기능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저 짧은 문장들의 나열일 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와 나만 이해하면 된다. 다른 누구의 이해도 필요하지 않다. 존대와 공손의 표현이 담긴 문장은 한국인들을 기분 좋게 만든다. 한국인들에게 하대의 표현은 비속어만큼이나 배알이 꼴리는 일이다. 그렇지만 글쓴이는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번역 앱에 있다.
아이의 부모는 내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당신이 내 아이의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다. 가급적 오랫동안 수업을 했으면 한다. 결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다음 달에 부산에 가서 다시 얘기하자.” 사실, 이런 경험은 내게 흔한 일이다. 한국인이었다면, 너는 말을 왜 그렇게 하니, 라며 따질 수도 있었겠지만, 외국인한테 그런 무용한 감정을 쏟는 일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지 않은가. 대부분의 일들이 그러하듯, 중요한 것이 우선으로 해결되면, 중요하지 않은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알아차리게 된다. 그리고 나는 이런 걸 순진한 대화라고 부른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대화일지도 모르는 순진한 대화. 꼭 필요한 얘기만 하면 되는 대화.

나는 그렇게 가끔 이방인과 대화를 나누곤 한다. 오해와 억측 대신 직선으로 전진하는 대화 말이다. 한국어를 탁월하게 구사하는 외국인을 만날 때가 더러 있는데, 도대체 어떤 노력을 더 하면 저렇게까지 할 수 있냐는 놀라움에 이어, 나의 외국어 실력에 주눅이 들고 이내 심란해진다. 그렇다. 나는 그렇게까지 절실하지 않았고 그렇게까지 노력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한국어를 매우 잘 구사하는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한글까지 완벽하게 표현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제가 방금 봤는데요. 도움이 될진 무르지만요. 온라인에서 찾았는데요. 이렇게 나우더라구요.”, “이것은 간단한 에시입니다. 도움이 됬으면 해서 울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노문 계속 쓰고 있어서 봉사에 참가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향가해 지는데로 참가 하겠습니다.”, “소고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속한 봉사단체의 외국인 회원의 글이다. 그녀는 대학원생으로 깜짝 놀랄 만큼 능숙한 한국어를 구사하지만, 한글은 어딘가 모르게 구멍이 나 있다. 그렇지만 그녀의 다정한 마음만은 글 속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당시 우리는 자격증 서식에 관한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중이었고, 그녀는 웹서핑으로 샘플을 하나 찾아 보내 주었다. 논문을 쓰고 있어 봉사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한가해지는 대로 꼭 참여하겠다는 다짐을 알려왔다. 우리는 종종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한다. 하지만 꼭 물어보고 싶다. “당신의 한국인들끼리 하는 의사소통은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한국인으로 태어나 어마어마한 한국어 경험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소통의 어려움에 시달린다. 귀담아듣지 않거나, 하고 싶은 말만 하거나, 언제나 그 둘이 문제다.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과 이웃하며 살게 될 것이다. 온라인이 되었건, 오프라인이 되었건. 이제는 그들과 무리 없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할 때이다.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은 기본 중의 기본값이니, 그딴 것으로 생색낼 생각은 그만 관둬야 할 것이다. 당신 앞에 선 외국인이 한글과 한국어에 능숙하다면 능숙한 대로,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대로, 우리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행동에 마음을 열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미래의 소통이자, 곧 소통의 미래일 것이다. 언제까지 한국인 하고만 얘기를 나눌 것인가.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별로 멋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외국어에 능숙하다면 좀 더 수고롭기를 바란다. 당신의 능력은 좀 더 분주해져야 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