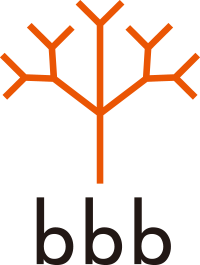여행은 죄가 없다
김은희 작가
여행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얘기를 가끔 듣는데, 그분들의 말이 대체로 옳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결론은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이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여러분, 여행은 경험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 구경한 거예요. 돈 들여서. 잘 차려입고. 유명한 관광지에 들러 사진 찍고 SNS에 올리고. 여행을 마치 대단한 경험인 양 얘기하지 마세요.”, “값진 경험이란 그 삶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잠깐잠깐 맛보는 게 아니라. 당신의 여행이 삶의 달고 쓴 맛을 모두 담고 있다고요? 아닐걸요?”, “건강을 망가뜨리는 것으로 여행만 한 게 없어요. 시차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는 경험을 하는 것인데, 몸이 그것을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국내 여행만 다닙니다. 그것도 짧게 짧게. 여행 다녀와서 어디가 아프다면, 혹시 여행이 원인이 아닌지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여행, 그거 대개 위험한 거예요.”
“도대체 그 많은 사람들이 쓰던 침대에서 어떻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죠? 어쩔 수 없이 바깥에서 잠을 자야 할 때면, 저는 아주 넓은 수건 여러 장과 베개 커버를 꼭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짐이 무거워서 싫었는데, 이제는 그냥 싫어요.”, “아니, 여행을 싫어할 수도 있지. 세상 사람들이 전부 여행을 좋아해야 합니까? 혼자만 여행 안 좋아한다고 그러면 유별나 보일까 봐 그동안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보니, 여행 좋아하는 당신들이 더 유별나 보이네요. 당신들이 좋아하는 그 여행,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새삼, 여행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해본 내가 이상할 지경이다. 여행은 이제 선택지가 되었다. 떠날 수도 있고, 떠나지 않아도 그만인 것이다.

몇 주 전, 프랑스에서 온 여행자 2명을 만났다.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었고, 오래전부터 약속된 만남이었다. 한 명은 보르도 근방에 있는 소도시에서 왔고, 다른 한 명은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는 이름을 말해줘도 잘 모를 것이라고 했다. 그래도, ‘사람을 뭐로 보고’, 하는 심정으로 다시 물었는데, 역시나 잘 모르겠더라. 그 둘은 유년 시절부터 단짝이었고, 10일 일정으로 한국을 여행하는 중이었다. 대략적인 일정은 서울-안동-경주-부산, 다시 서울이었다. 유독 프랑스인들이 안동을 빼먹지 않고 들르는데, 여기에는 뭔가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있는 듯하다. 누가 그 이유를 안다면 부디 알려 주시라. 아니 아니, 그 전에 내가 먼저 그 비밀을 밝혀내고야 말겠다. 게다가, 보르도 근방의 소도시 이름도 태어나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도시에 모여 사나 보다. 자신의 도시를 굳이 설명하거나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 말이다.
한 명은 헤드헌팅 회사에 근무하는 중이었으며, 다른 한 명은 사회복지사였다. 선진국에서 온 평범한 여성 직장인들이라니. 그들은 5주의 유급휴가 중 10일을 한국에서 보내기로 한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어김없이 K-컬처를 언급했다. 조금 특이한 점이라면, 그들은 고인 물이었다. 아이돌 1, 2세대를 언급했으며, 그들이 얘기한 영화와 드라마도 한물간 콘텐츠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그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소녀시대의 소녀들은 더 이상 소녀가 아닌 여자’라고도 했다. 나는 한국에 미쳐 있지 않은, 그들이 보기에 좋았다. 언젠가는 한국에 꼭 한 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내내 했었다고. 마음속에 잔잔한 물결이 일었다. 나와 비슷했다. 과거, 언젠가는 파리에 꼭 한 번 가봐야 한다는 생각을 품었으며, 기어이 다녀왔던 것처럼.

오늘도 나의 지하철은 한중일 3국이었다. 매일매일 외국인을 보고 듣는다. 예전에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구분하는 일이 쉬웠다. 그런데 지금은 좀 어렵다. 아, 일본인이구나. 아, 중국인이구나. 자주 그런다. 외형적 특징도 점점 하나로 수렴되는 느낌이고, 스타일로 마찬가지다. 물론, 신경 써서 들여다보면 아주 구분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게다가 지금은 한국인들도 다양성을 추구하다 보니, 내국인과 외국인이 만나는 접점에서 어색함이 거의 없다. 나는 그런 요즘이 마음에 든다. 늘, 더 많이 뒤섞이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더 많이 뒤섞인 것이 ‘오리지널’이었으면 좋겠다. 여기저기서 일본어가 들리고, 중국어가 들리고, 꼭 일본인과 중국인이 아니어도, 영어를 할 줄 아느냐는 질문으로 대화를 이어 나가고, 조금씩 배워온 한국어를 섞어 쓰면서, 이 낯선 재미를 만끽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캄보디아어가 들리고, 따갈로어가 들리고, 인도식 영어가 여기저기서 마구마구 들리기를 바란다.
외국인이 없는 나라는 없다. 있다면 그곳은 정말 이상한 나라일 것이다. 우리는 지금 ‘과 여행의 시대’를 살고 있다. 마치 세상 모든 사람이 여행하는 듯하다. 아마도 착시현상일 것이다. 하지만 뭐 어떤가. 만나고 헤어지고, 섞이고 들끓는 것보다 재미있는 게 또 있을까? 피곤하고 불편하지만, 잠깐이지 않은가. 기왕 한국에 왔으니, 한국을 뜨겁게 사랑하다 가기를 바란다. 우리도 당신을 뜨겁게 환영할 테니 말이다. 일을 하러 왔건, 잠깐 구경하러 왔건, 아주 살겠다고 작정하고 왔건, 그건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삶을 당신들과 나눌 것이다. 여행의 본질은 세상을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프랑스 친구들 얘기로 돌아와 예전 프랑스 여행에서 물가가 너무 비싸 겨우 마카롱 한두 개 사 먹는 것에도 지갑과 마음을 졸였다고 하니, 사람들이 얘기하는 파리지앵들은 마카롱 따위는 먹지 않는다며, 그럼 파리지앵들은 뭘 먹느냐고 물으니, 로컬 메뉴를 줄줄 읊어 대는 데 들어본 이름이 하나도 없었다. 거기에 더해, 베레모를 쓴 콧수염 난 할아버지가 자전거에 바게트를 싣고 달려가는 풍경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한국인들이 잘 아는 프랑스어는 샤넬이나 루이뷔통 같은 명품 브랜드 이름이 전부인 것 같다고. 슬슬 장난기가 발동한 나는 오전에 너희들이 다녀온 그 끝내주는 풍경의 기장 용궁사도 관광객들이나 가는 곳이지, 부산 사람들은 가지 않는다고 말해줬다. 부산지앵들에게 용궁사란 너희들의 마카롱 같은 것이라며. 다음날 가기로 예정된 감천문화마을도 색깔이 다른 마카롱이라고 했다. 셋이서 배꼽이 빠지라 웃어댔다.
그 기세를 몰아, 다음부터는 누가 K-팝을 묻거든 소녀시대나 빅뱅 대신 블랙핑크나 BTS를 좋아한다고 얘기하라고 했다. 그들은 이 농담을 아주 잘 이해했다. 한국을 좋아하되, 미쳐있지는 않은, 아주 건강한 젊은이들이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그나저나, 그 친구들은 한국에서 먹어본 음식 중 떡볶이를 최고로 꼽았다. 떡볶이는 물론이거니와, 떡 그 자체를 대단히 높이 평가했다. 많은 외국인이 떡볶이의 끈적끈적 달라붙는 식감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 또한 다 믿을 게 못 되는 말이었나 보다. 아니면, 대단히 마이너하고 마니악한 취향의 소유자들이었거나. 그러니 나는 그들을 잘 안다고도 잘 모른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다. 헤어지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다. “부디, 여행의 힘으로 당신의 삶이 더욱더 빛나기를 바란다”고. 약간 오글거렸지만, 영어니까 해볼 만했다.
한 백인 남성이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캐리어를 끈 채,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뒤에는 일행으로 보이는 여성 두 명이 따르고 있었다. 엘리베이터의 열림 버튼을 누른 채 기다려 주었다. 눈짓으로, ‘고맙습니다’와 ‘천만에요’를 주고받았다. 기왕 이렇게 된 것, 어디에서 왔느냐고 물으니, 자신은 영국인이고 일행은 아내와 딸이라고 했으며 아내는 스페인인이고, 딸은 그 둘 다라고 했다. 서울이 너무 멋졌고 이제 막 부산에 도착했는데, 오늘 부산 날씨가 왜 이렇게 별로냐며 약간 울상인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일기예보 내용과 함께 우산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전해주었다. 그런 다음, 진심을 꾹꾹 눌러 담은 말, ‘부산을 잘 즐기다 가시라’는 인사를 전하고 헤어졌다. 그날따라 흐렸던 부산 날씨가 죄가 없는 것처럼, 여행 또한 죄가 없다. 문화적 경험이 인생을 견인하지 않던가. 여행이야말로 문화적 경험의 ‘에센스 오브 에센스’이고. 좋은 여행을 하고 싶다면, 먼저 당신이 좋은 여행자이면 된다. 이것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나는 알지 못한다. 다른 방법을 알고 있다면 부디 알려주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