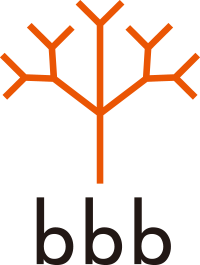지금 세계는, 지금 여기는
김은희 작가
수입품의 다른 말은 ‘귀한 물건’이었다. 바나나가 얼마나 귀한 과일이었는지, 파인애플이 얼마나 특별한 과일이었는지 잘 기억하고 있다. 비행기나 배를 타고 육지를 벗어나는 일은 상상만으로도 털이 쭈뼛쭈뼛 서는 경험이다. 환상, 그 자체. 우리가 상상하는 세계는 바로 그런 것이었다. 눈이 휘둥그레지고, 심장이 쿵쾅거리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이었다. 직업이 선원이었던 먼 친척이 선물로 준 유리병 맥심커피는 신줏단지 모시듯 다뤄졌다. 어린 시절 짝도 맞지 않는 옛날 살림 티스푼으로 그 귀한 커피를 눈곱만큼 떠서 사발에다 휘휘 저어 숭늉처럼 마시는 집안 어른을 본 적이 있다. 부잣집 반 친구가 도시락 반찬으로 가져온, 더 정확하게는 간식으로 가져온 슬라이스 치즈를 보며 그 맛이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다. 쓰고 보니, 정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다.

손안으로 들어온 세계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터키의 딜라이트도, 일본의 카스텔라도, 이란의 대추야자도, 손가락으로 핸드폰을 몇 번 톡톡 두드리기만 하면 하루 이틀 만에 집으로 배달되어 온다. 미국이나 캐나다 약국에서 판매한다는 별의별 건강보조식품도 눈 깜짝할 사이에 집으로 날아온다. 아보카도나 코코넛, 망고나 실란트로도 더는 신기한 눈길로 쳐다보지 않는다. 정말 ‘어머나, 세상에’다. 요즈음 사람들에게 세계란, 가보지 않고도 이미 잘 아는 곳이다. 하노이의 부촌은 어디인지, 카이로의 아파트 가격은 얼마인지, 홍콩의 미쉐린 맛집은 어느 골목에 숨어 있는지, 그들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등 도대체 모를 수 있는 게 없다. 그뿐만이 아니다. 지도의 정교함에 놀라고, 번역의 수려함에 또 놀란다. 마음만 먹으면 가지 못할 곳이 없고, 마음만 먹으면 알아듣지 못할 말이 없다. 세계는 손안으로 들어온 지 이미 오래다.
20대 친구들에게 물었다. 너희들에게 여행은 어떤 의미인가? “미지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특별한 모험인가, 아니면 호연지기의 실천인가?” 둘 다 아니라고 했다. 이런저런 의견들을 모아 보니, 그들에게 여행이란 자아의 색다른 확장이었다. 나에게 여행은 간절함이요, 해방구였다. 그리고 지적 호기심 실천의 장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힘이 잔뜩 들어간 나보다 훨씬 말랑말랑하고 풍요로웠다. 거대 담론에 매몰되지 않았으며, 자신을 사랑할 줄도 알았다. 여행이 드디어 땅으로 내려온 것이다. 그들은 신상 카페를 찾듯 여행을 떠난다. 오지에 가야지만 모험이 가능하다는 생각도 쓸모를 다한 것처럼 보인다. 세계라는 거대한 덩어리에 새로운 서사가 입혀지는 중이다.

자아의 확장인 여행
해운대 마린시티 아파트 단지 근처 놀이터를 지나다 보면 외국 아이 절반, 한국 아이 절반인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지금은 한국인 누구도 외국과 외국인, 외국 물건을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심지어, 나의 지인 중 하나는 여행을 무척 싫어한다. 하룻밤 머무는 여행도 고민이 깊어지는 사람이다. 앉은 자리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깊어질 수 있는데, 굳이 먼 길을 떠나는 그 마음을 이해 못 하겠다고 했다. 나의 지난 여행을 복기해 본다. 고백건대, ‘괜히 떠나왔구나’ 싶을 때도 적지 않았다. 물론 꽤 많은 여행이 나를 성장시켰고 기쁨으로 가득 채웠다. 하지만 가끔은 여행자들의 맹목적인 여행 찬양이 불편하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다. “이봐, 여행자 양반, 좀 더 솔직하지, 그래?” 만약 눈 뜨자마자 매일매일 새로운 여행지를 탐험해야 한다면, 내게 주어진 거대한 자유 앞에 질식당할지도 모른다. 여행은 그렇게 뜨뜻미지근한 일상이 되어 버렸다. 이 얼마나 환영할 만한 일인가!
낡은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지금의 세계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과거의 세계와 다르다. 동양을 향한 시선도, 서양을 해석하는 방식도 달라졌다.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어마어마한 세계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방대한 세계정보를 실시간으로 경험한 적이 있었던가. 20대들의 말이 맞았다. 우리의 여행은 자아의 확장이어야 한다. 우리의 몸은 비록 한곳에 정박해 있지만, 우리의 눈과 마음은 저 너머로 향해 있어야 한다.

마침 지하철이 모 대학교 근처를 지나고 있었다. 학생으로 보이는 외국인 여성 두 명이 내 옆에 서서 재잘재잘 수다를 떨고 있었다. 그들의 말은 흡사 아름다운 음악 소리 같았다. 아랍어 같기도 했고, 프랑스어 같기도 했다.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그녀들은 프랑스에서 왔으며, 한 명은 니스, 다른 한 명은 처음 들어본 도시였다. 각각 국제관계학과 국제무역을 전공하는 학생이었으며, 현재 석사과정에 있다고 했다. 한국에 온 지는 2년 남짓, 한국말은 아주 조금만 안다고 했다. 영어로 수업하고 있으며, 공부가 아주 재미있다고도 했다. 학교 근처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투룸에 친구랑 함께 살고 있으며, 지금은 조금 멀리 떨어진 곳으로 외출하는 길이라고 했다. 한국이, 특히 부산이 아주 마음에 든다고 했다. 부산이 마음에 든다고 하니 나 또한 기분이 좋았다.
나는 젊은이라면 누구나 유럽 배낭여행과 미국 어학연수를 꿈꿔야만 하는 그런 시절을 살았다. 지금 생각하니, 좀 서글프다. 지금은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와 이목구비가 다른 이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놓여 있던 보이지 않는 위계도 꽤 많이 사라졌다. 작금의 우리는 ‘여기가 곧 세계’인 곳에 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