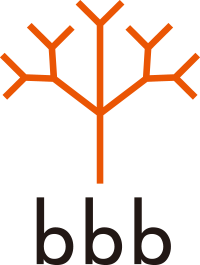당신은 우크라이나어를 하십니까
강인욱_경희대 사학과 교수
러-우 전쟁이 3년 반이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우크라이나어’라는 것이다. 나를 포함한 러시아에서 생활한 사람들은 주변에 많은 우크라이나 출신 지인들이 있다. 하지만 정작 우크라이나어를 들을 기회는 거의 없었다. 대부분 러시아어를 잘하기 때문이다.
내가 처음 우크라이나어를 접한 것은 러시아 유학 시절이었다. 당시 우크라이나 시골에서 유학을 와서 별명이 ‘하홀’(우크라이나인들의 독특한 머리 형태, 그 지역 사람을 유머 있게 부르는 별칭이다. 우리로 하면 경상도 문디, 강원도 감자바위 정도 되는 셈이다)이 있었다. 친구 하홀의 집에 놀러 갔더니 그의 할머니가 계셨다. 할머니는 손자의 친구를 보고 반가운 마음에서 이것저것을 물어봤지만,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를 보고 친구들이 눈만 뻐끔뻐끔하다가 껄껄 웃으며 러시아어로 통역을 해주었다. 우크라이나의 시골에서 평생 농사를 지었던 할머니라 우크라이나어만을 사용하셨다고 한다. 하지만 사실 그 주변에 있던 러시아 사람들은 그냥 사투리 정도로만 생각했기에 크게 불편을 못 느꼈던 듯하다.

나에게도 수많은 우크라이나어 지인이 있었지만, 나와 러시아어를 쓰는 데에 큰 불편함이 없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코미디언으로 활동할 때도 러시아어를 구사했다. 실제 젤렌스키가 2017년 이전에는 우크라이나어를 했다는 영상이나 기록이 없어서 그의 모국어가 러시아어라는 추정도 있다. 사실 대부분의 우크라이나 사람은 러시아어를 사용했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사투리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스파시바)를 ‘댜쿠유’로 한다는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냥 대화 중에 일어나는 해프닝에 가까웠다. 게다가 시베리아에는 수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이주해 왔지만, 그들의 언어적 정체성은 크지 않았다. 우크라이나어로 쓰인 말들도 약간 불편해도 어떻게든 뜻이 통하는 정도였다.
이런 상황은 러-우 전쟁을 기점으로 급변했다. 도시들의 이름도 갑자기 바뀌었다. 국어연구원과 각종 방송 매체는 키예프 대신에 키이우, 하리코프 대신에 하르키우라는 용어로 사용했다. 짜장면을 표준어로 인정하는 데에 20년이 넘게 걸리는 보수적인 언어 체계에서 매우 예외적인 예가 되었다. 심지어 전쟁 초기에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공식적인 회의에서 러시아어 금지’라는 훈령을 통과시켰지만, 정작 의원들은 우크라이나어가 서툴러서 회의 중에 ‘이번까지만 러시아어로 회의합시다’라고 말하는 촌극도 있었다.

이제 3년이 지나면서 전쟁 초기와 양상은 많이 달라졌다. 이제 우크라이나어도 좀 더 뚜렷하게 서쪽 우크라이나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리고 전쟁의 충격을 겪은 사람들은 러시아어를 터부시하게 되면서 이제 그들의 언어는 서로에게 적대적인 칼날이 되고 있다. 예전 영호남의 갈등이 극대화되었을 때 광주나 대구에서 각각 상대 지역의 사투리를 쓰면 여러 가지 삶의 고초를 겪는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내려왔고 여러 영화의 소재로 쓰이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그냥 지역감정이 낳은 해프닝이었다면, 러-우 전쟁은 수백만 명의 희생으로 이어졌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새로운 체제가 성립되면 당분간 러시아어와 우크라이나어는 서로 쓸 일이 없을 것이다. 어쩌면 서로 간에 일부러 못 들은 척을 하면서 통역을 앞세우는 촌극도 자주 벌어질 것이다.
나에게도 비슷한 예가 있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문화회관에서 우연히 북한의 전시회를 하고 있었다. 순간 반가운 마음이 들었으나 자칫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지는 않을까 불안해했다. 그런 사정도 모르는 내 친구는 한국 사람이라고 반갑다고 그쪽으로 가서 나를 소개했고, 상대방 북한 사람들도 몇 초가 지나자 웃음이 사라지고 얼굴에 긴장이 돌았었다. 그 순간 나는 빠르게 러시아어로 질문하고 상대방도 얼른 알아차리고 같이 온 통역원을 거쳐서 대화할 수 있었다. 나는 평양에서 온 분들이 전시회를 마치고 잘 돌아가시길 기원했고, 그분들은 부디 발해와 옥저 같은 한민족의 역사를 많이 찾아내서 널리 알리는 데에 더 노력하시라는 덕담을 해주었다. 우습지만 우리는 통역을 거쳐서 그 모든 대화가 이루어졌다.

극단에 치닫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마치 한국전쟁 같은 동족상잔의 비극이었다. 사투리 정도 같았던 그들의 언어는 이제 빠르게 양분되고 있다. 단순히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금지어가 되고 있다. 이번 학기에 내 지도 학생이 된 우크라이나에서 온 유학생에게 이메일을 보내며 편한 러시아어로 쓰다가 결국 지우고 한국어와 영어로 써야 했다. 작은 언어 선택조차 전쟁의 상처를 의식하게 만드는 시대인 것이다.
수백만 명의 피와 눈물이 흐른 자리에서, 언어는 분리와 적대의 기호로 굳어지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언어는 다시 다리를 놓을 가능성도 품고 있다. 전쟁이 끝나고 시간이 흐른 뒤, 언젠가는 서로의 말을 이해하고 웃으며 대화하는 날이 다시 올 수 있지 않을까. 그 희망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언어를 이야기하는 이유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