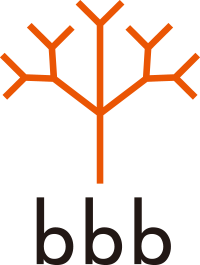누가 봐도 외국인, 그러나 뼛속까지 한국인
김은희 작가
한국에서 가장 역동적이며, 어쩌면 가장 예측 불가능한, ‘사람 냄새’ 나는 도시는 어디일까? 답은 정해져 있다. 바로 부산이다. 그런 부산에서 뿌리를 깊게 내리며 살아가고 있는 뼛속까지, 아니 영혼까지 한국화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한다. 그들의 이야기는 뻔한 ‘K-컬처 체험기’가 아니다. 인생이 원래 매운맛과 단맛의 콜라보라지만, 그들이 경험한 부산살이의 매운맛과 단맛이 어떤 결의 느낌일지 궁금하지 않은가?
부산은 만만치 않은 도시이다. 특히 비즈니스의 세계는 더욱 그러하다. 외국인이라 해서 봐주는 것? 없다. ‘빨리빨리’의 정신과 상도가 지배하는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현지인보다 더 현지인다워야 한다. 광안리 근처에서 수제 맥줏집을 운영하는 캐나다 출신 제이슨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자. “처음에는 ‘이 공간은 캐나다 스타일이니까 천천히 갑시다’라고 했죠. 딱 일주일 갔어요. 토요일 저녁 6시쯤부터 손님들이 문을 밀고 들어오는데, 주문하고 5분 안에 맥주가 안 나오면 눈빛이 레이저가 돼요. 이제는 제가 직원들한테 먼저 소리 질러요. ‘야! 빨리빨리! 4번 테이블에 피처 하나 더!’ 한국말도 아닌 것이 영어도 아닌 것이, ‘Pali-pali’를 외치는 제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더라고요.” 제이슨은 겉보기에 근육질의 백인 남성이지만, 맥주 서빙할 때의 손놀림과 홀을 훑는 매의 눈은 영락없는 한국 사장님 그 자체이다. 특히, 배달앱 리뷰 관리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별점 4.5점 이하 리뷰가 올라온 날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밤잠을 설친다.
“가장 힘든 건 ‘단골’ 문화예요. 한 번 온 손님이 ‘나 단골인데 왜 서비스 안 주냐?’ 할 때요. 캐나다에서는 팁을 주지만, 여기서는 정을 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단골 테이블에 슬쩍 감자튀김 몇 개 더 끼워주면, 그분들 갑자기 저한테 ‘우리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럴 땐 헷갈리죠. 내가 아들인가, 사장인가?” 제이슨의 말 속에는 부산에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외국인들의 고충과 적응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건, 물건을 파는 것을 넘어 관계를 파는 것임을 깨달은 것이다. 이 복잡미묘한 감정 노동이 바로 한국살이의 쓴맛이자, 동시에 깊은 맛을 내는 장점이다. 일단 한 번 단골이 되면, 그 끈끈함은 혈연만큼 강하다.

‘뼛속까지 한국인’의 진정한 테스트는 바로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진다. KTX 표 예매, 은행 창구 업무, 그리고 부산의 상징인 아지매들과의 관계 설정 등이다. 프랑스 출신으로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10년째 동래구에서 살고 있는 마리옹은 이제 프랑스에 가면 ‘완벽한 이방인’ 취급을 받는다고 털어놓는다. “어느 해인가 프랑스에 갔는데, 마트에서 줄 서서 계산을 기다리는데 제가 무심코 ‘아이고, 느리다! 좀 비켜봐요!’라고 얘기하더래요. 남편이 기겁하더군요. 저도 모르게 부산 사투리의 공격성과 효율성을 체화한 거예요. 제 말투를 그때 그 프랑스어로 듣는다면 프랑스인들은 무례하다고 느낄 거예요.” 마리옹은 이제 ‘수고하소’(수고하십시오), ‘밥 뭇나?’(밥 먹었니?) 같은 짧고 굵은 부산 사투리를 구사하며 시장에서 흥정의 달인이 되었다.
그런 그녀가 얘기하는 한국살이의 장점은 바로 ‘편의성’이다. “새벽 3시에 국밥을 먹고 싶다고요? 10분 만에 배달이 와요.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죠. 그런데 단점은, 너무 편해서 제가 너무 게을러진다는 거예요. 게다가, 모르는 사람들이 저에게 너무 친절한데, 그 친절함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질문들이 있어요.” 그녀는 몇 년 전 공원에서 만난 한 할머니에게서 들은 질문을 잊지 못한다. “아가씨, 한국 남자랑 결혼했는데, 와 아는 안 낳노? 낳으면 가는 고마 한국 사람인데.” 마리옹은 웃으며 대답했다. “할머니, 제가 오늘 아침에 소고깃국만 세 그릇을 먹었어예. 저도 뼛속까지 한국인입니더!” 이 유머러스한 답변에 할머니는 손뼉을 치며 그녀에게 붕어빵을 건네줬다고 한다. 한국인의 ‘정’은 따뜻하지만, 그 ‘정’의 대가로 사생활을 조금 내어줘야 하는 문화, 이것이 바로 부산살이의 아이러니한 매력이다.

한국살이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맵고 달고 짜고 신, 이 모든 맛이 뒤섞인 비빔밥이다. 남미 출신으로 부산의 한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카를로스는 한국의 술 문화에 깊이 빠져있다. “처음엔 소주가 너무 썼어요. 마치 소독약 같았죠. 그런데 한국 친구들이 ‘원샷!’을 외치고, 제가 힘들어하면 ‘괜찮아, 괜찮아’하면서 등짝을 때려주는 그 정겨운 폭력(웃음)이 좋았어요. 다음 날 머리가 깨질 듯 아픈 건 단점이지만, 그 전날 밤에 느꼈던 소속감, 우리라는 느낌은 다른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감정이에요.” 카를로스는 이제 술자리에서 소주를 잔에 따른 후, 한국식으로 한 손으로 받치고 주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술자리에서 자신에게 술을 권하는 사람에게 “아이고, 저 이제 안 받으려고 했는데, 주시니 감사히 받겠습니다!”라고 능청스럽게 말하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지만 부산살이의 가장 큰 단점은 경쟁이라고 그는 말한다. “한국은 너무 완벽해요. 모든 것이 정해진 틀 안에 있어요. 학벌, 직장, 심지어 예능 프로그램까지. 외국인인 저에게도 ‘넌 여기서 뭘 할 거니? 평생 교사만 할 거니?’라는 질문이 그치지 않아요. 끊임없이 다음 스텝을 밟아야 한다는 압박감, 이 피로감이 가장 힘들죠.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은 느낌. 이럴 땐 해운대 백사장에 드러누워 ‘아무것도 안 하리라’ 다짐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또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저를 발견합니다. 아마도 제 뼛속에 ‘열정’이라는 부산 특산품이 주입된 것 같아요.”

부산에서 만난 뼛속까지 한국인인 외국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다. 제이슨은 이제 맥줏집 손님이 “어, 외국인 사장님이 한국말을 잘하네?”라고 하면 씅질부터 난다고. 그래서 “잘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마 제 국어입니다!”라고 대꾸한다고. 마리옹은 프랑스에 갔을 때, 길을 걷다 어깨를 부딪친 사람에게 자신도 모르게 ‘아이고, 죄송합니다!’가 아닌, ‘느그 아부지 뭐하시노?’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고 했다. 물론 농담이다. 이 정도는 우리 다 이해하지 않는가? 한국살이, 특히 부산살이는 이들에게 단순한 이주가 아닌, 영혼의 개조 과정이었다. 한국의 효율성에 감탄하고, 단골의 ‘정’에 감동하며, 소주와 매운 음식에 길들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겉모습은 바꿀 수 없지만, 사고방식, 반응속도, 심지어 감탄사(‘아이고’, ‘진짜로’)까지 한국인으로 바뀌었다. 누가 봐도 외국인이지만, 이제는 뼛속 깊은 곳까지 해운대 파도 소리, 자갈치 시장의 활기, 그리고 뜨끈한 국밥의 정이 새겨진 ‘부산인’이 된 것이다. 이 유쾌한 이방인들의 이야기는, 우리 자신에게 ‘진정한 한국인다움’이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그들의 삶에 박수를 보내며, 나는 오늘도 그들과 함께 뜨끈한 국밥에 소주 한 잔을 기울인다. “이모, 여기 쏘주 한 병 더 주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