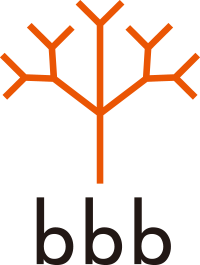외국어 발음하기: 소통과 차별의 경계에서
강인욱_경희대 사학과 교수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 평생을 따라다니는 숙제가 있다면 단연 ‘외국어’일 것이다. 말문이 트이기 무섭게 시작되는 영어 조기교육부터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 그리고 승진을 위한 어학연수까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통번역의 장벽이 낮아졌다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유창한 외국어 구사 능력은 능력과 계급을 상징하는 절대 반지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면 외국어 능력이 언제나 환대받았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와 다른 말을 쓴다는 것은 차별의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되기도 했다. 역사 속에서 낯선 언어는 ‘능력’이 아니라 ‘미개함’의 표식이었다.
오랑캐(=바르바르)의 어원
우리가 흔히 쓰는 ‘오랑캐’라는 말의 기원을 살펴보면 그 차별의 역사가 선명히 드러난다. 조선 전기 문헌에 자주 등장하는 여진계 집단 ‘울량합(兀良哈)’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유력하다. 이는 몽골제국과 남시베리아 일대에 거주하던 ‘우량가이(Uryangqai)’라는 명칭과 뒤섞이며, 북방의 이방인을 뭉뚱그려 부르는 멸칭으로 굳어졌다. 흥미로운 점은 서양에서도 이와 유사한 오해가 있었다는 것이다. 문명 세계를 자처했던 고대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의 말을 하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내는 소리가 마치 ‘바르바르(bar-bar)’하고 짖는 것 같다고 하여 ‘바르바로이(barbaros)’라고 불렀다. 이것이 오늘날 야만인을 뜻하는 ‘바바리안(Barbarian)’의 어원이다. 즉,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랑캐’나 ‘야만인’은 특정한 민족을 지칭하기보다는, 내 귀에 들리지 않는 소음을 내는 낯선 존재들을 타자화하고 조롱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치적 언어였던 셈이다.
힘들었던 역관의 삶
서로 다른 민족 간의 언어를 통하게 하는 역관의 대우 또한 그리 좋지 않았던 것 같다. 조선시대 통역관이었던 역관(譯官)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보인다. 그들은 사대부 양반이 아닌 중인(中人) 계급이었다. 성리학적 질서 안에서 외국어는 통치를 위한 실무 기술일 뿐, 고귀한 학문의 대상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역관들은 언어 그 자체보다는 그 언어를 무기 삼아 얻을 수 있는 부수입에 더 큰 의미를 두었다. 사행길에 오르며 챙겨간 인삼과 은을 팔아 막대한 차익을 남기는 무역상으로서의 면모가 그들의 진짜 힘이었다. 조선의 거상 임상옥이나 역관 거부들의 일화가 보여주듯, 그들에게 외국어는 지적 허영심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생존과 부를 위한 처절한 수단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는 목적이 ‘생존’과 ‘성공’에 있다는 점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하다.

발음으로 사람을 죽인 관동대지진
언어는 때로 날카로운 칼이 되어 사람을 베기도 한다. 특히 미세한 ‘발음’의 차이는 피아(彼我)를 구분하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가장 손쉽고도 잔혹한 기제가 되기도 했다. 구약성경 사사기 12장에는 발음 하나로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적인 학살의 기록이 등장한다. 바로 ‘십볼렛’ 이야기다. 기원전 12세기경,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길르앗 사람들과 에브라임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 길르앗이 이겼는데, 문제는 에브라임 사람들의 외모가 비슷해서 구분이 안 되었다고 한다. 이에 길르앗 사람들은 이삭 혹은 흐르는 물을 뜻하는 ‘십볼렛(Shibboleth)’를 발음하라고 시켰다. 에브라임 방언은 ‘쉬[ʃ]’대신에 ‘스’라고 발음을 하기 때문에 쉽게 차이가 났다. 그렇게 혀끝에서 갈린 바람 소리로 죽은 에브라임 사람이 4만 2천 명에 달한다고 되어 있다.
‘십볼렛’의 이야기는 머나먼 성경의 한 구절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선조들이 핍박받은 이야기이기도 하다. 100년 전인 1923년 일본 관동대지진 당시의 일이다. 지진으로 민심이 흉흉해지자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일본인들은 조선인을 무차별하게 학살했다. 그때 일본인 자경단은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15엔 50전(十五円五十銭)”을 일본어로 말해보라고 강요했다. 일본어로 ‘쥬고엔 고짓센’은 한국인에게 잘 구분이 안 되는 탁음(濁音)이 섞여 있다. 한국 사람들은 잘 못하는 그 미묘한 차이가 들리면 자경단은 무자비하게 폭력을 가했다. 심지어 지방 사투리를 쓰는 일본인이나 발음이 어눌한 중국인까지도 조선인으로 오인당해 죽임을 당했다. ‘십볼렛’의 망령이 지금까지도 이어진 셈이다.

지금도 이어지는 십볼렛의 망령
물론 오늘날 발음이 조금 틀렸다고 해서 목숨을 잃지는 않는다. 하지만 ‘현대판 십볼렛’은 여전히 우리 곁에 맴돌고 있다. 한국어의 ‘F’와 ‘P’ 발음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패션의 첫 글자가 P로 시작되는 거로 아는 거 아니야?”라며 농담하거나, 반대로 외국인이 어눌한 한국어 발음을 하면 뒤에서 그를 흉내내며 킥킥대기도 한다. 외국을 자주 다니는 나 역시 여러 나라를 다니며 발음 때문에 곤혹스러운 일을 겪곤 했다. 차라리 우리말에 없는 ‘V’나 ‘F’는 새로 배우면 되는데, 가장 큰 난관은 의외로 ‘R’과 ‘L’이었다. 프랑스어의 ‘R’은 목구멍 깊숙한 곳을 긁으며 소리를 내야 하고, 러시아어는 혀끝을 앞니 뒤에 대고 “에르르르” 하며 강하게 떨어야 한다. 중국어의 ‘R(권설음)’은 혀를 둥글게 말아 입천장을 밀면서 말해야 한다.
나에게는 오히려 가장 쉬울 것 같았던 영어의 ‘L’이 복병이었다. 우유(Milk)를 자신 있게 ‘밀크’라고 발음했더니 상대방이 전혀 알아듣지 못해 당황했던 기억, 학생들과 함께한 해외 답사에서 호기롭게 맥주(Beer)를 달라고 외쳤다가 계산서(Bill)를 받아 들고 무안해했던 기억은 지금도 얼굴을 붉어지게 한다. 아마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좌충우돌 외국어 흑역사 하나쯤은 있을 것이다. 웃으면서 이야기할 외국어 해프닝을 다양성으로 이해하며 미소로 들어주는 대신 차별의 낙인을 찍는 경우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발음이 조금만 이상해도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으로 낙인찍고, 그 사람의 지성이나 인격마저 깎아내리는 태도는, 낯선 언어를 짐승의 소리로 치부했던 고대인들의 ‘바르바로이’적 사고방식, 그리고 요단강 나루터에서 발음을 근거로 칼을 휘둘렀던 야만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언어가 차별로 이어지는 순간
한국 사회에서 외국어는 곧 ‘서양어’, 그중에서도 영어를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불어와 독어가 지성의 상징처럼 여겨졌고, 냉전 이후에는 러시아어와 중국어가 붐을 이루기도 했다. 우리가 ‘외국어’라고 부르는 대상은 언제나 당시의 국력과 경제적 이익에 따라 춤을 췄다. 그렇게 각광받는 일부 외국어를 제외한 다른 나라의 언어는 ‘제3세계의 낯선 소리’로 치부되고 놀림감이 되곤 한다. 최근 혐중 정서에 편승해 중국어 인사말인 ‘셰셰’를 조롱거리로 삼는 세태 또한 언어를 힘의 논리로만 바라보는 서글픈 단면이다.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 스마트폰 하나면 전 세계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AI가 실시간으로 통역을 해주는 시대에, 단순히 단어를 외우고 발음을 굴리는 기술적인 외국어 능력은 그 효용이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외국어에 대한 태도는 ‘소통’이 아닌 ‘이해’다. 낯선 억양과 서툰 발음 속에 숨겨진 상대방의 진심을 읽어내려는 노력, 나와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이 ‘오랑캐’가 아니라 나와 같은 감정을 지닌 인간임을 인정하는 태도야말로 다가올 시대의 진짜 언어 능력이 아닐까. 언어는 차별과 학살을 위한 ‘십볼렛’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오해를 풀어내는 ‘이해의 방정식’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