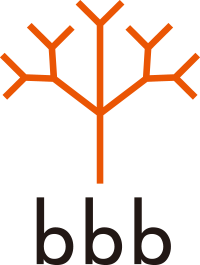Your name, please
강인욱_경희대 사학과 교수
미국에서 가장 흔한 카페인 스타벅스에 가면 주문이 끝나면 진동벨을 주는 대신에 컵에 이름을 매직으로 쓴다. 각각의 손님이 대접받는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라고 한다. 몇 달러 안 하는 커피이지만 일일이 내 이름을 써주고 또 내 이름이 불리는 것은 기분 좋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처음 미국에 갔을 때 스타벅스에서 사소한 이 주문의 과정에 나만의 고민이 시작되었다. 내 본명을 굳이 말하면 발음도 어렵기 때문이다. 간단히 성을 말하면 십중팔구 ‘Ken’으로 알아듣는다. 어떤 때는 내 이름의 끝 자를 따서 유케이(UK)라고도 하게 되었다. 조금 적응되니 이제 아예 구글 두들처럼 그때그때 생각나는 이름으로 커피를 주문하게 되었다. 록그룹 Queen을 듣고 있을 때는 Freddie로, 북한이 전쟁 위협을 한 날에는 Kim이라고 부르고 혼자 킥킥대곤 했다. 물론, 나도 내가 불러준 이름을 까먹고 뒤늦게 머리를 긁적이며 커피를 탄 적도 있었다.
한국의 이름은 서양인들에게는 아주 어렵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와 달리 서양에서 이름은 작명이 아니라 선택에 가깝기 때문이다. 영어권에서는 새 식구가 태어나면 축하의 인사와 함께 “Did you pick up your daughter’s name?”이라고 물어본다. 러시아어로도 “ты выбирал имя?(이름 골랐니?)”라고 말한다. 수백 개의 이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사실 요즘 미국을 보면 사정은 조금 달라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살기도 하고 개성 있는 이름을 선호하다 보니 정말 이름들이 다양하다. 하지만 러시아의 경우는 아마 자주 쓰이는 이름 50여 개가 전체 인구의 2/3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다양한 민족이 함께 사는 나라에서는 다양성을 존중하되 서로 편하게 통할 수 있는 이름이 발달했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 한글은 물론 한자에 큰 의미를 담아서 받는다. 이름을 신성시하는 풍습이 있다 보니 그렇게 줄여서 부르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예도 있었다.

한국의 경우 더 큰 문제가 있으니, 바로 표기법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비교적 발음하기 쉬운 내 이름도 In Uk, Inuk, In-Uk, In-Wook, Inwook 등으로 표기될 수 있다. 하물며 외국인들이 발음하기 어려운 ‘현정’, ‘원철’같은 이름의 표기는 정말 들쭉날쭉하다. 요즘같이 모든 이름을 입력하는 인터넷 시대에 한 자라도 틀리면 곧바로 에러가 나거나 검색 자체가 되지 않는다. 빅데이터가 오고 가는 시대에 독특하지만 쉬운 이름으로 검색이 용이하게 하는 것이 큰 경쟁력이 되기 때문이다. 내 이름만 해도 몇 개의 영문 표기가 존재하는 탓에 제대로 검색이 되지 않는다. 내 잘못도 아닌 게 한국의 학술 잡지에서 내가 투고한 논문의 이름에서 자신들의 원칙으로 이름을 적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도 아닌데 왜 내가 내 이름을 제대로 쓸 수 없냐고 항의했건만 학회의 원칙이라며 난색을 표명하곤 했다.
검색에서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핸디캡을 넘어서 아예 망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2012년에 연구년으로 스탠퍼드 대학교에 있었을 때의 일이다. 구소련권의 자료가 많았던 스탠퍼드 도서관에서 1906년에 나온 스코틀랜드 탐험가인 로렌스 워델이 쓴 기행기 ‘티베트 라싸의 역사’의 러시아어 번역본을 발견했다. 100여 년 전 러시아와 영국이 그레이트 게임을 벌이며 중앙아시아를 경쟁적으로 탐험하던 시기였다.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귀한 자료인데 정작 나는 처음 본 책이라 기쁜 마음으로 며칠에 걸쳐서 세심하게 스캔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미 PDF 판이 인터넷에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음성적인 것이 아니라 저작권이 소멸하여 공식적으로 배포가 되는 것이다. 그럼 내가 왜 티베트 고고학 자료를 검색했을 때 찾을 수 없었을까 억울한 마음에 찬찬히 살펴보니 사소한 문제였다. 티베트의 수도인 ‘라싸’의 표기법이 당시 러시아에서는 S가 하나 더 있는 ‘Лхасса’라고 썼기 때문이었다. 사소한 표기법 하나가 100여 년 전 귀한 자료를 영영 못 보게 만들 뻔한 것이다.

사실 이것은 비단 영어 표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반대로 한국어로 외국어를 표기할 때도 문제가 된다. 한국어 표기법이 현실과 맞지 않고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짜장면이라는 단어가 허용되는 데에 온 국민이 단결(?)하여 반발해도 10여 년 넘게 걸릴 정도로 보수적이다. 하지만 러-우 전쟁이 일어나자 갑자기 키예프를 ‘키이우’로, 또 하리코프를 ‘하리키우’ 등으로 하루아침에 바꾸었다. 물론, 나라가 독립하면서 표준어가 바뀌고 이에 따라 표기법이 바뀌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독립하고 30년이 넘도록 러시아어식 표기법을 고집하다가 갑자기 바뀐 것은 앞의 ‘짜장면’과 같은 원칙과는 달라서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또한 이슬람의 ‘수니’파는 한국어 원칙에 어색하다는 이유로 ‘순니’파라로 표기하게 한다. 백여 개가 넘는 외국어의 발음이 이런 식으로 재단 된다. 내가 주로 하는 러시아어나 중국어도 현실에 맞지 않아 그것을 고치는 데에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러시아어의 경우는 영어식 표기법에 맞추어서 표기를 하도록 규정되어서 러시아 관련 용어를 사용할 때는 마치 일본의 가나처럼 훈독과 음독이 다르게 읽는 경우처럼 다시 변환해야 한다. 나는 지난달에 1960년대 북한학자와 만주에서 고조선의 유적을 발굴한 중국 고고학자의 일기를 발굴하여 번역 출판했다. 번역 이후 몇 차례에 걸쳐 현재 중국어 발음 원칙에 따라 고유명사를 바꾸는 작업을 하느라 많은 시간이 들었다.

지금은 검색의 시대이다. 아무리 훌륭한 내용이라고 해도 제대로 검색이 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일까? 김춘수의 시 ‘꽃’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는 구절이 있다. 그것을 패러디해 본다면 “내가 그의 이름을 ‘제대로’ 구글링해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정보를 제공했다.” 정도가 되지 않을까?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를 알아가고 사랑하는 첫 단계이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 않는가.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언제라도 검색이 되는 모두가 부르고 이해할 수 있는 국제적인 표기법이 등장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