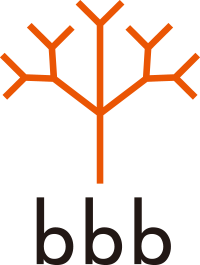당신의 존칭은 무엇입니까?
강인욱_경희대 사학과 교수
얼마 전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이 크게 유행한 적이 있다. 서로에게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한 제목이었다. 그런데 사람에겐 존칭도 함께 있다. 생소해 보이지만 상대 문화에 대한 깊은 의미를 상징하는 것이 존칭이다. 내가 경험한 복잡한 러시아어의 존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상 수많은 나라들은 풍속이 다른 것처럼 서로를 부르는 존칭도 다양하다. 존댓말의 경우 나라마다 발달한 정도가 서로 달라서 한국처럼 뚜렷하게 반말과 존댓말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보다는 덜 발달하였다. 반면에 친한 사람과 공식적인 존칭은 대부분의 언어에서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
러시아어를 포함한 슬라브어계는 영어와 달리 꽤 분명하게 존칭이 있다. 러시아어의 존칭은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함께 붙여서 부르는 것이다. ‘누구의 아들 누구’ 씨가 된다. 러시아의 대문호 푸시킨의 경우 이름이 알렉산드르이고 아버지 이름이 세르게이이다. 그러니 공식 석상에서 푸시킨을 부른다면 세르게이의 아들 알렉산드르 씨를 뜻하는 ‘알렉산드르 세르게이비치’라 부르면 된다. 처음 러시아에서 살면서 힘들던 부분은 바로 상대방의 존칭을 부르는 것이었다. 지도교수인 몰로딘 교수님은 존함이 ‘뱌체슬라브 이바노비치’이니 급하게 선생님을 부르다 놓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교수님들 앞에서 질의 응답하거나 학회모임을 가면 각 사람의 존칭을 제대로 맞춰서 부르는 것이 여간 고역이 아니었다.
비공식적이나 친한 경우이면 그냥 이름만 불러도 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친구들끼리 불러주는 애칭이 따로 존재한다. ‘알렉산드르’라는 이름의 경우 ‘싸샤’, ‘슈라’, ‘싸냐’ 등 다양하게 애칭이 있다. 러시아 소설을 보면 한 사람을 부를 때 이렇게 5~6개의 명칭이 대수롭지 않게 등장한다. 그러니 한국어로 번역을 해놓고 보면 난해하게 보여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자주 있다.
사실, 이렇게 아버지와 선조의 이름을 연달아 붙이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이다. 다만 영어에서도 맥도날드의 Mc, 존슨의 ~Son처럼 아버지의 이름(Patronym)은 성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그 전체를 불러야만 존칭의 완성이 된다는 점에서 특별히 어렵다. 이렇게 상대방의 이름을 장황하게 부르는 것은 때로는 코미디의 소재가 되기도 하니, 수십 년 전 코미디에서 유행했던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도 원래 일본 에도시대 유행했던 희극 소재였다.
독일의 극작가 칼 메이(Karl May)가 쓴 모험 소설에는 카라 벤 넴시스(Kara Ben Nemsis)가 오토만제국을 여행할 때 그와 함께하는 베두인 출신 현지 동반자의 이름이 무려 ‘Hadschi Halef Omar Ben Hadschi Abul Abbas Ibn Hadschi Dawud al Gossarah’이다. ‘핫지 할레프 오마르’가 본 이름이고 그 뒤에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이름이 붙은 것이다. 때로는 희화화될 정도로 복잡하지만, 여하튼 상대방 ‘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과 집안에 대한 존중을 의미한다.

내 이름은 이누크 이바노비치
1990년대 러시아로 유학 간 나에게 온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였다. 그런데 러시아어에서는 그 표현이 좀 달라서 “당신을 어떻게 부르나요?”라는 뜻이다. 다양한 상황에서 이름은 서로 바뀐다는 뜻도 된다. 다행히도 내 이름은 러시아어로는 발음하기 쉬운 ‘이누크’로 들린다. 러시아어 특성상 단어의 끝에 오는 자음은 격음이 되기 때문이다. ‘씨’나 ‘선생님’이라는 호칭 없이 발굴장과 학회장에서 ‘이누크’로 부르는 게 신기했던 모양이다. 그 모습을 본 한국에서 온 동료 고고학자들도 사방에서 불러대는 나를 ‘이누크’라 부르는 바람에 한동안 한국에서도 별명이 되었다.
그런데 공식적인 자리나 학회 발표 자리에서 ‘아버지의 이름’까지 붙인 풀네임이 없으니, 뭔가 어색하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결국 시베리아 발굴장에서 ‘이누크 이바노비치’라고 아예 나에게 존칭을 붙여주었다. 가장 흔한 이름인 ‘이반’을 붙인 것이니 우리로 말하면 외국인이 김 씨나 이 씨 성을 붙인 격이 되었다. 그렇게 ‘이누크 이바노비치’로 부르더니 자기들끼리도 입에 감긴다며 좋아하더니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내 풀네임처럼 불리곤 했다. 물론, 진짜 공식 자리에서는 ‘프로페서 강’이라는 명칭이 있다. 하지만 러시아식 존칭을 부른다는 것은 그들만의 특별한 친밀감을 표현한 것이다. 우리도 외국인이 친해지면 한국식 이름을 붙여주는 식이다. 비공식적인 나만의 존칭은 지금도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종종 쓰곤 한다.
지금은 러시아도 많이 국제화가 되어서 존칭으로 사람을 부르는 것은 외국인들에게 어렵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경우는 많이 사라졌다. 하긴, 시간이 돈인 현대 사회에서 한가롭게 존칭을 부른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름, 쉽지만 어려운 상대를 이해하는 방법
이름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지정하는 것을 넘어서 상대에 대한 애정, 그리고 존경, 상호 관계가 함축적으로 녹아들어 있다. 이제 국제화가 되면서 한국 사람이 부르기 어려워하는 호칭 대신에 외국어 이름을 따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부모님이 주신 이름을 그렇게 쉽게 바꾸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국도 예로부터 이름 이외에 ‘호’나 ‘자’라고 하여 친구들 또는 스스로 부르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니, 이상한 것은 없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름은 흔한 영문 이름을 부르는 식이 많은 것 같다. 미국 같은 다문화 사회에서는 호칭이 워낙 까다로울 테니 최대한 간결하고 쉽게 기억하는 소통법이 일반화된 탓이다. 빠르게 세계화가 진행되었다고 해도 각 나라의 문화에 더욱 깊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문화마다 발달한 존칭법을 정확히 배우고 불러주는 것만큼 상대에 대한 존중도 없을 것이다. 세계화와 함께 각 나라에 맞는 적절한 존칭을 배워보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