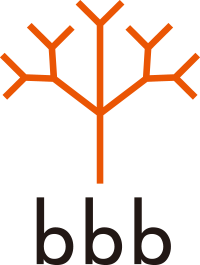이국, 이국적인 것 그리고 초과된 이국
김은희 작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여행 중인 사람들이 보내오는 사진에 종종 놀란다. 도대체 내가 사는 곳이랑 뭐가 얼마만큼 다른지 모르겠다. 옷차림도 비슷하고, 먹는 음식도 비슷하고, 심지어 어떤 액션에 대한 리액션도 비슷하다. 우리와 여러모로 흡사한 동아시아는 물론이거니와, 저 멀리 바다 건너 풍경도 크게 다르지 않다. 동네에 새로 생긴 카페나 쇼핑몰에 다녀왔다는 인증샷을 보았다. 내가 머무는 곳 반경 5킬로미터 이내에 틀림없이 유사한 공간이 있을 것임을 확신할 수 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유튜브 인터뷰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차림이나 동작도 전혀 이질적이지 않다. 내가 아는 꽤 많은 사람도 그렇게 입고 그렇게 손짓발짓한다. 쉽게 말해, 얼굴만 갈아 끼웠다고 할까. 박물관은 수백 년째 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 호텔 또한 뻔하게 화려하다. 물론 작정하고 꼬투리를 잡는다면 비슷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얼추 비슷할지도 모른다. 그저 찍힌 사진 몇 장과 동영상으로 그런 생각을 한다니, 그럴 수도 있다. 찍힌 세계의 장면보다 찍히지 않은 세계의 장면이 더 많을 것이므로, 내 느낌이 틀렸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작금은 인증샷으로 세계를 인식하고 구성하는 시절이다. 훗날 그것이 오역으로 판정 나면, 새로 고침의 시간을 보내면 그뿐. 하지만 묻고 싶다. 재연되지 않은, 혹은 재연되지 못한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 있다면 제발 좀 알려달라. 그리고, 이 거대한 세계를 왜곡 없이 재연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 또한 함께 알려달라. 그래서 나는 나의 오역을 의심하지 않는다. 단언컨대, 세계는 지금 프랜차이즈화되고 있다.

지하철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서 전화가 걸려 왔다. “알로?” 아, 외국인이었구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는데, 앞서가던 여성이 핸드폰으로 장문의 타이핑을 보내고 있었다. 아, 일본인이구나. 커리어 두세 개씩 끌고 어딘가로 향하는 이방인들은 이제 흔한 풍경이다. 단기든 장기든 정착한 외국인들은 한국인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더 이상 그들이 궁금하지 않다.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을 위해 약간의 친절은 늘 주머니에 넣어 다닌다. 피차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끼리 나누는 영어 대화란 얼마나 에센셜한가. “나는 반드시 저곳까지 가야 하는데 이곳에서 길을 잃었어.” 류의 대화는 아름답기까지 하다. ‘죽을 때까지 이런 방식의 대화만 나누면 좋겠어’라는 생각까지 했었다.
말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다. 이젠 그런 바람 같은 대화를 어디서든 나눌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맛이 예전 같지 않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이국에 매료된 까닭은 나를 켜켜이 둘러싼 환경과 이국의 환경이 아주 많이 달라서였다. 하지만 지금은 도처에 이국과 이국적인 것들이 넘쳐흐른다. 심지어 이국보다 더욱 이국적인 초과된 이국들로 사방이 그득하다. 료칸에 가기 위해 일본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것이다. 후무스를 먹기 위해 프랑스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것처럼. 세계는 지금 고유한 속성의 소멸을 맞이하고 있다. 혹은, 그 고유한 속성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눈앞에 내놓기 몹시 부끄러운 어떤 것이 되어가고 있거나. 혹은, 그 또한 손쉬운 대상화로 전락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일부러 배제했거나, 사람들은 누군가가 다녀온 길을 기를 쓰고 쫓아간다. 이해한다. 나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려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없다. 사람들은 처음 가보는 곳도 익숙하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잘 모르겠다.

가끔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다. “여기에 와보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후회가 되었을까?”, “아니지, 여기에 와보지 않았더라면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애당초 모르기 때문에 후회라는 감정을 쓸 수가 없지. 그 표현도 와봤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좋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표현이지. 따라서 더욱 정확한 표현은, 여기에 와보지 않았더라면 이런 곳이 있는지도 모른 채 남은 생을 살았을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불행한 삶은 아니었을 거야. 그리고 세상에는 하나의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 모르긴 해도 아직 가보지 않은 저기도 썩 괜찮은 곳일지 몰라.”
우리는 어딘가로 가는 것과 가지 않는 것을 동시에 해낼 수 없다. 하지만 사진의 등장으로 얘기가 달라졌다. 사진은 아직 가보지 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었고, 우리는 그 숱한 사진들로 세계를 지어 올렸다. 그리고 지금은 더 이상 사진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진은 흔하디 흔한 것이 되어 버렸고, 마침내 우리를 배신하기까지 이르렀다. 나는 신문이나 잡지에 실린 사진을 딱 절반만 믿는다. 그 사진을 찍고자 했던 이의 의도만 헤아릴 뿐. 사진이 사실의 재현이라면 내가 찍은 사진과 누군가가 찍은 사진이 똑같아야 할 것이다. 풍부한 색감으로 아프리카와 아프리칸을 피사체로 담아낸 사진을 볼 때면, 카메라의 성능부터 의심하게 된다. 초과된 실제이기 때문이다. 내 눈으로 본 아프리카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대체 사진에다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아프리카는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비단 아프리카만의 문제겠는가. 아시아든, 아메리카든, 유럽이든 예외가 없다. 사진은 우리를 딱 그 세계의 입구까지만 데려다 놓았다.

세계는 점점 대량 생산된 기성품이 되어 가고 있다. 한때 세계는 샐러드 볼처럼 제각각으로 고유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디를 가더라도, 익숙한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진다. 인프라스트럭처가 유사하고, 제공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유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상관없이 인스타그래머블한 세상에 살고 있다. 국경을 지워버린 세상에서, 조금씩 모양을 변주한 스타벅스를 탐험하고 있는 것이다. 혹자는 그곳도 세상이라, 혹은 우리 사는 세상의 바깥이라 여길지 모른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나는 좀 더 바깥으로 나아가고 싶다.